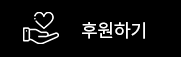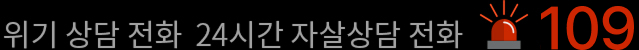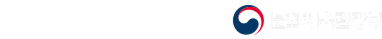[가톨릭평화신문] 극단적 선택 청년 "사실은 살고 싶어요"
관리자 | 2022-12-02 | 조회 1017

청년이 지고 있다. 지난해 20대 사망자 2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78명 중 56.84%인 1579명이다. 2030세대 자살률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은 과연 죽고 싶었을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청년들
“죽겠다고 8층짜리 건물 옥상 난간을 넘어가 서 있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차’ 싶었죠. 10분 정도 난간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동안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살고 싶었어요.”
유소현(가명, 31, 마리안나)씨는 8년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불과 20살 때만 해도 그는 정의로운 경찰을 꿈꿨다. 좋은 경찰관이 되리라며 다짐했던 그의 꿈은 4년 만에 마른 낙엽과 같이 바스러졌다. 계속되는 실패에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남들과 비교하는 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도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현실은 그를 낙담하게 했다. “제가 겪는 고통 하나하나가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무력감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다녔던 학원 건물 옥상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박하은(가명, 25)씨는 중학생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방문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다. 그는 “본격적으로 비관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건 2019년쯤이었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울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의 부모를 ‘엘리트주의가 심했던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부모는 직접적으로 자녀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평소 언행에서 성적, 외모, 성격 등에서 높은 기준을 보였고, 박씨는 스스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환 학생에 선발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멋진 어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몸만 컸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수 없는 건 똑같더라고요.” 살아남아도 또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은 그를 더욱 절망에 빠트렸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황순찬(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역임) 교수는 “자살 예방은 사라져가는 사람들을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지만, 사람은 삶의 일정 조건들이 충족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살 원인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고 싶은 충동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이만 있어도 자살 충동은 크게 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교회에서도 외면받는 단어, ’자살’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사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뿐만이 아니다. 교회에서 또한 ‘자살’이라는 주제는 매우 터부시 되고 있다. 자살자라는 이유로 장례 미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1983년 교회법(제1184조)을 개정해 자살자의 장례 미사를 거절하도록 한 원칙을 철회했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촌 주교는 11월 19일 ‘슬픔 속 희망 찾기-자살 예방을 꿈꾸는 우리들의 마음 축제’에서 “어느 날 신자들이 찾아와 ‘본당에서 자살자에 대한 장례미사를 선뜻 거행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는 누구라도 패배 의식에 빠지거나 자신감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큰 고통 속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은 고인들이기에 더욱 장례 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다. 2030세대 청년 자살률은 2017년 20.64명에서 지난해 25.42명이 됐다. 불과 5년 사이 23.16% 늘었다. 2018년 이래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타 연령층에 비해 독보적인 증가세다. 2020년 기준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도 고의적 자해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